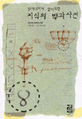우리 중고등학교 때 도종환 선생의 접시꽃 당신과 더불어 양강 체제를 이루었던 서정윤의 홀로서기. 물론 난 서정윤을 한 번도 좋아해본 적이 없으며, 심지어 홀로서기 같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했다.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, 손발이 오글거리는 그런 시는 딱 질색. 뭐랄까, 겉멋이 잔뜩 들어간 시라고 해야 하나. 서정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, 어쩌랴, 처음부터 좋아지지 않는 것을…
근데 좋아하지도 않는 시와 시인이 지금 왜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? 그것도 무슨 다른 연상작용에 의해 생각나는 것도 아니면서.
'그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꽃이름을 모르겠다. 하긴 몰라서 더 좋은 건지도… 그나저나 오늘 더울 듯. (0) | 2012.04.24 |
|---|---|
| 지난 토요일만 해도 몽우리밖에 없더니 이틀만에 꽃이 활짝 폈다. 이러다간 이번 주말이 오기도 전에 지는 거 아냐? (0) | 2012.04.16 |
| [영화] 언 애듀케이션 | 론 쉐르픽 | 2009년 (0) | 2010.10.08 |
| 얼마간 리코 GRD3에 꽂혀 있었는데 드디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. (0) | 2010.07.15 |
| 얼마전 인화한 사진으로 만들어 본 window shade. (0) | 2010.06.08 |